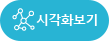| 항목 ID | GC07501370 |
|---|---|
| 한자 | 金馬人石-由來 |
| 영어공식명칭 | The Origin of Man-made Stones in Geumma |
| 분야 | 구비 전승·언어·문학/구비 전승 |
| 유형 | 작품/설화 |
| 지역 | 전라북도 익산시 |
| 시대 | 조선/조선 전기,현대/현대 |
| 집필자 | 신송 |
| 채록|수집|조사 시기/일시 | 2011년 8월 18일 - 「금마 인석의 유래」 송양규에게 채록 |
|---|---|
| 수록|간행 시기/일시 | 2017년 - 「금마 인석의 유래」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행한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5-13 전라북도 익산시 편에 수록 |
| 관련 지명 | 금마면 -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
| 채록지 | 동용리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
| 성격 | 설화 |
| 모티프 유형 | 풍수담 |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에 있는 인석과 관련하여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금마 인석의 유래」는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에 있는 인석이 세워진 풍수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이다.
「금마 인석의 유래」는 2011년 8월 18일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에서 송양규에게서 채록하였으며, 2017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행한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5-13 전라북도 익산시 편에 수록되어 있다.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에서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으로 가는 길에는 논 한가운데에 작은 하천을 사이에 두고 쌍으로 서 있는 인석이 있다. 동편 석상 뒤의 ‘군남석불중건기(郡南石佛重建記)’ 비석에는 1858년(철종 9)에 익산군수 황종석(黃種奭)이 넘어져 방치되어 있던 것을 다시 세웠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금마는 산들이 일자로 서 있어서 물도 일자로 나간다. 역학에서는 산도 도망가고 물도 도망가면 그 터에서는 종살이밖에 못한다는 말이 있다. 즉, 지금의 지형으로는 큰 인물도 나오지 않고, 돈도 못 모으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인석을 세웠다는 것이다. 그래서 금마가 고향인 사람은 금마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외지 사람들이 와서 출세하고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금마 인석의 유래」는 ‘풍수담’이다. 큰 인물이 나오지 못하고 돈도 모으기 어려운 지형의 풍수적 문제를 인석을 세워 해결하려 하였다는 내용이다.
- 『익산군지』(익산군지편찬위원회, 1981)
- 『익산시사』(익산시사편찬위원회, 2001)
-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5-13-전라북도 익산시(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www.history.go.kr)
- 원광대학교 대안문화연구소(http://www.iso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