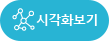| 항목 ID | GC07501424 |
|---|---|
| 한자 | 三韓金馬 |
| 영어공식명칭 | Samhangeumma |
| 분야 | 구비 전승·언어·문학/문학 |
| 유형 | 작품/문학 작품 |
| 지역 | 전라북도 익산시 |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 집필자 | 박세인 |
[정의]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익이 삼한 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전라북도 익산에 도읍한 마한의 역사적 정통성을 주장한 글.
[개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인 이익(李瀷)[1681~1763]이 마한(馬韓)·변한(弁韓)·진한(辰韓) 등 삼한(三韓)의 지리적 위치와 마한이 전라북도 금마(金馬)[지금의 익산시]에 도읍하게 된 역사적 연유를 밝힌 글이다. 이익의 자는 자신(子新), 호는 성호(星湖)이며, 문집으로는 『성호사설(星湖僿說)』이 있다. 이익은 출사하지 않고 평생을 향촌에서 강학과 저술에 힘쓰며, 당시 사회 실정을 혁신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에 매진한 학자이다. 이익의 학문은 집안으로는 이병휴(李秉休)·이용휴(李用休)·이중환(李重煥)·이가환(李家煥) 등으로 이어졌다. 또한 학자들로는 안정복(安鼎福)·권철신(權哲身)·정약용(丁若鏞) 등에게 계승되면서 18세기 조선의 경세치용(經世致用) 학풍이 정립되는 데 중심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이익은 우리나라 고대 역사와 지리적 권역의 고증에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 「삼한금마」는 삼한 중에서도 마한의 역사적 계통과 정통성을 보다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글이다.
[구성]
「삼한금마」는 이익의 문집인 『성호사설』 2권 천지문(天地門)에 수록되어 있다. 『성호사설』은 천지문(天地門)·만물문(萬物門)·인사문(人事門)·경사문(經史門)·시문문(詩文門) 등 다섯 개의 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천지문에 기술된 글은 주로 천문과 지리에 관한 내용들이다. 「삼한금마」는 중국 문헌에 수록된 삼한에 관한 기록을 소개하고, 마한의 역사적 유래와 권역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삼한금마」는 최치원(崔致遠)[857~?]이 삼한과 고대 삼국과의 연계성을 주장하였으나, 최치원의 주장을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중국의 『후한서(後漢書)』와 『신당서(新唐書)』 등에 기록된 마한·변한·진한의 위치와 지리적 권역, 세 국가 간의 역사적 관계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뒷부분은 기준(箕準)의 마한 건국과 유래, 마한과 백제와의 관계, 그리고 도읍지인 전라북도 금마에 대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의의와 평가]
우리나라 고대 국가의 정통성이 삼한, 특히 마한에 닿아 있다는 ‘삼한정통론(三韓正統論)’에 입각한 역사적 관점을 살필 수 있는 글이다.
- 『성호사설(星湖僿說)』
-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