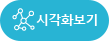| 항목 ID | GC07500015 |
|---|---|
| 한자 | -老鋪 |
| 영어공식명칭 | A shop selling stories, a store of old standing |
| 분야 | 생활·민속/생활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기획) |
| 지역 | 전라북도 익산시 |
| 시대 | 현대/현대 |
| 집필자 | 이현수 |
[정의]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긴 역사와 고유의 이야기를 가진 가게들.
[개설]
많은 이들이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강조하고 있다. 타인의 경험이나 이야기 속에 들어 있는 요소에 공감하고 그 이야기를 자신의 방식으로 다시금 전하는 일. 최근엔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의 발달로 특정한 몇몇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스토리텔러(Storyteller)’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가진 힘은 무엇일까. 덴마크의 미래학자 롤프 옌센(Rolf Jensen)은 저서 『드림 소사이어티(The Dream Society)』를 통해 브랜드를 넘어 고유한 스토리가 가진 가치를 역설하였다. 다시 말해 대기업 공장에서 만든 빵을 사 먹기 위하여 줄을 서는 일은 없지만, 지방의 작은 소도시 빵집이라도 ‘이야기’가 있다면 그 빵을 사 먹기 위해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줄을 서는 일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이야기는 요소가 가진 가치를 확장시키며, 나아가 특유의 전파력을 통해 그 무엇보다 훌륭한 홍보 수단이 되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이 가진 고유의 스토리를 발굴하고 콘텐츠로 개발하여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전라북도 익산시에는 다양한 노포(老鋪)들이 있고, 또한 저마다 고유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가게, 아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가게. 즉 익산 속 ‘이야기를 파는 가게’를 알아보고자 한다.
[딸을 찾던 어머니의 맥줏집 ‘엘베강’]
익산역 삼거리 앞 작은 골목을 지나면, 간판도 조명도 다소 촌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맥줏집 하나를 만날 수 있다. 2016년 지금의 장소로 이전하였는데, 예전에는 내부 공간조차 좁았다. 맥주잔을 부딪칠 때마다 옆 사람의 어깨와 부딪히는 일이 예사였지만, 처음 보는 낯선 이에게도 웃음을 건넬 수 있는 곳. 이곳은 맥줏집 ‘엘베강’이다.
엘베강이 처음 익산역 앞에 문을 연 건, 알고 보면 매우 안타까운 사연 탓이다. 40여 년 전 군산에 살던 김칠선이 제주도를 다녀오던 길에 기차에서 셋째 딸을 잃어버리고 만 것. 김칠선은 딸을 찾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허사였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오가던 이리역 앞이면, 혹여 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1982년 호구지책으로 차린 것이 바로 엘베강이었던 것. 다행히 2009년경 잃어버렸던 딸을 극적으로 만날 수 있었지만, 그 애타던 기다림의 시간이 역으로 익산 시민에게 준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오죽하면 2012년 ‘익산시민창조스쿨’에 참여한 7080 익산 추억 찾기팀의 설문조사 결과, 엘베강은 ‘익산 추억의 장소’ 3위에 선정되었을 정도다.
꽁꽁 얼린 얼음 잔의 시원한 생맥주와 중독성 있는 맛에 저렴하기까지 한 오징어 입 안주. 엘베강은 고단한 하루를 보낸 익산 시민의 쉼터이자 사랑방이었으며, 원광대학교를 다니던 젊은 청춘들이 호주머니 걱정 없이도 마음껏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일까. 화가 김성민이 대학생 시절 엘베강의 풍경을 담아낸 그림부터, 이제는 유명 화가가 된 그 시절 단골들이 하나하나 기증한 작품들이 가게 안 벽면 곳곳을 채우고 있다.
한번 다녀가면 그 맛을 잊지 못해 서울에서도 기차 타고 찾아온다는 엘베강은 이제 김칠선의 가족이 운영하고 있지만, 40여 년의 추억을 마시기 위해 찾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정겨운 모습이다.
[무(無)간판이 유(有)간판이다 ‘간판 없는 짜장면집’]
익산시 낭산면에서 함열읍으로 이어지는 삼거리. 주변은 온통 논뿐인지라 식당 같은 건물을 찾아보기 어려운 곳인데, 지나는 사람마다 부른 배를 두드리고 있다. 가만히 살펴보니, 오래된 가정집같이 생긴 곳에 사람들이 들고나기를 계속하고 있다. 바로 무(無) 간판이 유(有) 간판인 곳, 40여 년 가깝게 한자리를 지켜 온 ‘간판 없는 짜장면집’이다.
간판 없는 짜장면집이 처음부터 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초, 큰 태풍이 몰아칠 때 위험하다 생각해서 간판을 내렸는데, 미처 다시 간판을 달지 못한 것. 그사이 가게를 다녀간 사람들이 이곳 짜장면 맛을 입소문 냈고, 가게 간판이 없던 탓에 ‘간판 없는 짜장면집’이라고 전해지던 것이 지금에 이른 것이다. 당연히 지금은 간판이 생겼지만, 간판에는 여전히 ‘간판 없는 짜장면집’이라고 쓰여 있다.
그런데 이곳의 짜장은 낯설기까지 하다. 이 가게의 짜장 속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고기도 없거니와, 심지어 짜장을 볶지 않고 큰 무쇠솥에 끓여서 만들어 낸다. 먹고살기 위해서 식당을 열었고, 메뉴를 짜장으로 정하였지만 전문적으로 중식을 배워 본 적이 없으니, 솥에 끓여 냈던 것. 그러니 사람들이 익히 아는 짜장의 맛과는 분명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가게가 유독 사람들의 입소문을 탄 것은 양파와 감자, 춘장만으로 맛을 낸 옛날의 소박한 짜장면 맛 때문이다.
본래 이 가게의 이름은 ‘시거리식당’이었다고 한다. 가게 앞 삼거리의 옛 이름이 ‘시거리’였던 탓. 지금도 가게 앞 삼거리에는 큰 나무가 있는데, 거리를 오가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쉬어 가려 모인 까닭에 시끌벅적하다는 의미로 ‘시거리’가 되었고, 그 이름을 따서 가게의 이름을 지었던 것이다.
어쩌면 그곳에서 쉬어 가던 사람들이 처음 먹어 본 짜장은 바로 이 짜장이었을지 모른다. 평생 잊히지 않을 그때 짜장면 맛의 기억이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을 시거리에 모이게 하는지 모른다. 아니, 전국 곳곳에서 어린 시절 처음 먹어 본 소박한 짜장면의 맛을 그리워하는 이들은 지금도 추억을 먹기 위해 시끌벅적 낭산면 시거리로 모여들고 있다.
[토렴으로 말아낸 정성어린 순댓국 ‘정순순대’]
옛 이리 중앙극장 부근, 영화나 쇼를 보고 나온 사람들이 출출한 배를 채우기 위하여 들르던 가게가 있었다. 입구에는 갓 삶아 낸 돼지 내장이 모락모락 김을 내고 있고, 사람들은 돼지 내장과 내장 삶아 낸 국물에 잔술로 막걸리를 마시곤 하였다. 시간이 흘러 이리역이 현대사에 참혹한 비극의 현장이 되었던 1977년 그날에도 말이다. 이곳은 익산 중앙시장의 ‘정순순대’이다.
정순순대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하나는 순도 100%를 자랑하는 피순대. 전라북도 지역의 순대가 가진 특징은 돼지 선지로 속을 채운 피순대이다. 하지만 오로지 선지로만 가득 채운 순대를 먹고 싶다면 익산 정순순대만한 곳이 없다.
가게 주인 박정순은 어린 시절 고향 부안에서 먹었던 피순대의 맛을 기억해, 지금의 피순대를 만들었다고 한다. 물론 만드는 법을 몰랐으니 돼지 내장을 가져다주는 사람에게 물어서 해 볼 수밖에 없었다고. 특히 선지 외에는 넣지 않으니 만드는 도중 조금만 창자가 찢어지면 선지가 흐르는 것은 당연지사. 그만큼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일 수밖에 없다. 지금의 피순대는 부단한 노력의 결과물인 셈. 고소한 피순대의 맛을 즐기고 나면 다른 순대는 쉽게 손이 가지 않는다.
또 하나는 팔팔 끓여 내지 않는 토렴의 정성이다. 토렴이란 국물을 부었다 따라 내기를 반복하면서 음식을 데우는 방법이다. 물론, 음식을 데우는 것만 생각하면 끓여 내는 방법 만한 것이 없다. 하지만 토렴의 과정을 통해 밥알 사이사이에 국물의 맛을 입히면서도 데움에 시간을 들이니 소화마저 돕는다. 하지만 토렴이란 그만큼 손이 많이 가는 과정이다. 팔팔 끓여서 손님상에 나가는 국밥이 많은 요즘, 토렴은 그야말로 귀한 정성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는 토렴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순대국수이다. 밥이 아닌 국수를 토렴의 과정으로 데워 내서 말아 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 순대국수이다. 지금은 무척이나 독톡한 메뉴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예전에는 시장을 찾는 서민들이 즐겨 먹던 것이 순대국수라고 한다.
시장 주변으로 아직 초가집이 많았던 1970년대 초반, 정순순대는 장터를 삶의 터전으로 삼던 사람들의 따뜻한 밥집이었을 것이다.
지금은 왠지 한 TV프로그램 덕분에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전에도 이 가게는 있었다. 40여 년 전에도, 아니 주인장이 가난조차 재산처럼 여기며 살아온 50여 년 전에도, 시장을 찾던 서민들의 추억 속에 이곳은 아담한 몸집이지만 유달리 손만은 컸던, 주인장의 마음마저 넉넉한 밥집이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건, 정성과 노력 ‘진미식당’]
비빔밥으로 유명한 곳은 전주이다. 옛 느낌이 물씬 나는 놋그릇에 담긴 형형색색의 재료들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귀한 한 상을 대접받은 기분이다. 마치 조선 시대의 양반이 된 것 같은 기분이 아닐 수 없다. 전주의 비빔밥은 품격이 느껴진다. 하지만 그런 비빔밥만 있을까?
석재로 유명한 황등, 최고급 화강암을 생산하던 그곳에는 종일 울려퍼지던 돌 깎는 소리만큼, 사람들의 소리도 끊이질 않았다. 자연히 시장이 열리고, 큰 소시장도 열렸다. 역사도 짧지 않으니 일제 강점기의 일이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허기진 이들이 밥집을 찾는 일은 당연지사이니 시장에 들어온 채소와 우시장을 통해 공급되던 질 좋은 소고기가 만나 한 밥집의 메뉴가 되었다. 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넉넉한 비빔밥 한 그릇, 바로 ‘진미식당’이다.
실제의 역사는 80여 년이 넘었을 거라고 한다. 지금 식당을 운영하는 이는 3대 이종식이다. 병환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게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원래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식당 일로 무척이나 바빴던 부모님. 그에게 식당은 어린 시절, 부모님을 빼앗아 간 아픔의 장소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2대 사장인 어머니 원금애가 가게에서 손을 뗀 건 아니다. “음식은 주인이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한다는 어머니 원금애. 여전히 음식 곳곳에는 여든이 넘은 어머니의 정성이 우러나 있다. 혹시라도 오랜 세월 지켜 온 음식 맛이 변하기라도 할까 봐 걱정이었던 것. 얼핏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음식 조리 과정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었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 음식은 엉뚱한 맛을 내곤 하였다.
그러니 “아낌없이 내놓아라.”라는 어머니의 말 또한 비단 재료에 국한된 말은 아닐 테다. 되레 재료는 변할 수도 있다. 그 시절의 재료들을 똑같이 구하기 어려운 탓이다. 효율성과 편리함이 주가 된 세상은 원하지 않더라도 그 시절의 재료들을 사라지게 한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오직 단 하나 80여 년, 3대를 이어 온 정성과 노력뿐일 테다. 이종식 또한 가게의 대표가 된 지 15년여가 흘렀다. 좋은 음식을 위하여 생활 습관까지도 바꿨다는 그의 모습은 한 그릇의 비빔밥이 담아낼 수 있는 또 다른 품격을 느끼게 해 준다. 진미식당의 비빔밥은 그래서 80여 년 전의 황등과 지금의 황등을 이어 주는 매개의 역할을 오늘도 묵묵히 해내고 있다.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모두 소개하지 못하였지만, 그 외에도 많은 노포들이 익산에 있다. 그리고 그보다 많은 노포들이 사라져 갔다. 중앙동의 영정통이 번화하였던 시절, 그 위세를 짐작하게 하였던 ‘회관거리’의 모습도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 화교들을 통하여 발달하였던 중식당들 또한 익산의 대표적인 노포였지만 하나, 둘 문을 닫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화려하였던 그 시절의 이야기는 여전히 익산 시민들 속에서 추억으로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노포에 추억만 있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노포의 고유한 이야기를 찾아서 가게를 찾았던 사람들은 다시금 그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써 간다. 지금 이 순간순간이 가게의 새로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포는 오늘도 새롭게 태어난다.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포는 결국 어느 하나 노포가 아니다.
- 롤프 옌센, 『드림 소사이어티(The Dream Society)』(리드리드출판, 2005)
- KBS 2TV, 『2TV생생정보』(2019. 8. 12.)
- EBS 다큐프라임 이야기의 힘 제작팀, 『이야기의 힘』(황금물고기, 2013)
- 「엘베강! 30년 추억을 마신다」(『익산열린신문』, 2014. 8. 21.)
- 「[문화&공감]익산 낭산 ‘간판 없는 짜장면집’」(『전북일보』, 2016. 8. 23.)
- 「[이야기가 있는 맛집(301) ‘정순순대’ 한시동·박정순 부부」(『데일리한국』, 2017. 11. 25.)
- 「석공에게 가장 만만한 ‘황등비빔밥’…비빈 밥 위 한 줌 육회 ‘화룡점정’」(『영남일보』, 2018. 4. 6.)
- 「[이야기가 있는 맛집(320) ‘진미식당’ 이종식 대표」(『데일리한국』, 2018. 4. 14.)
- 「익산 엘베강, ‘술맛’ 하나로 우리들 추억 속에 남다」(『문화저널』, 2018. 11.)
- 대한민국 구석구석(https://korean.visit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