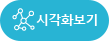| 항목 ID | GC07501298 |
|---|---|
| 영어공식명칭 | Heungtaryeong |
| 이칭/별칭 | 「남도흥타령」 |
| 분야 | 구비 전승·언어·문학/구비 전승 |
| 유형 | 작품/민요와 무가 |
| 지역 |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소맹마을 |
| 시대 | 현대/현대 |
| 집필자 | 박세인 |
| 채록 시기/일시 | 2011년 1월 20일 - 「흥타령」 제보자 최규태에게 채록 |
|---|---|
| 채록지 | 제보자 최규태 자택 -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소맹마을
|
| 성격 | 남도민요 |
| 토리 | 육자배기토리 |
| 박자 구조 | 중모리장단 |
| 가창자/시연자 | 최규태 |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에 전하여 오는 남도민요.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소맹마을에서 불러지는 「흥타령」은 전라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하여 오는 대표적인 남도민요이다. 전라도 지역에서 불리는 「흥타령」은 「천안삼거리」로 알려진 「경기도흥타령」과 구분하기 위해 「남도흥타령」이라 부르기도 한다. ‘흥타령’이라는 명칭은 “아이고 대고 흥/ 성화가 났네 흥.”이라는 후렴구에 ‘흥’, ‘흐응’ 등의 노랫말이 반복된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맹마을에서 채록된 「흥타령」은 일반적인 「흥타령」과 달리 후렴구가 단순하고 ‘흥’이라는 조흥구도 변형되었다.
2011년 1월 20일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소맹마을의 제보자 최규태에게서 채록된 「흥타령」의 가락과 노랫말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펴낸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실려 있다.
전라도 지역에서 불리는 「흥타령」의 장단은 경기도 지역의 「흥타령」과 다른 구성을 보인다. 경기도의 「흥타령」이 대체로 굿거리장단에 경토리로 되어 있다면, 남도의 「흥타령」은 중모리장단에 육자배기토리로 부른다.
소맹마을 「흥타령」의 가사는 가난에 대한 한탄, 임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과 원망을 절절히 토로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수 놈의 가난이야/ 부자는 누가 내고 가난은 누가 내나/ 북두칠성님이 내었든가/ 꿈아 꿈아 무정한 꿈아/ 꿈이거든 깨우지를 말고/ 생시거들랑 잠든 날만 깨워나 다오// 어냥헤야// 말은 가자고 내 굽을 치는디/ 님은 꼭 붙들고서 놓지를 않네/ 가다가 가다가 내가 □□ 어저께가 되면/ 죽은 혼령된 님 따라 내 갈라오// 어냥헤야// 세상사를 다 믿어도 못 믿을 것은 님이로세/ 책방으로 계실 제는 보고보고 또 보아도 귀골로만 보시더니/ 못 믿겼네 못 믿겼네 얼굴도 나는 못 믿겼네// 어냥헤야.”
「흥타령」은 전라북도 익산 지역 외에도 전라도 여러 지역에서 두루 전하여 오는데, 지역에 따라 사설이나 후렴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며 불리고 있다.
「흥타령」은 「육자배기」, 「농부가」 등과 함께 전라도 지역 민중의 사랑을 받은 오래된 민요이다. 남도민요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화려하고도 구슬픈 가락에 인생무상, 사랑과 이별, 가난 등 다양한 삶의 애환을 얹어 부르고 있다.
-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5-13-전라북도 익산시(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 손인애, 「남도민요(잡가) 「흥타령」에 대한 사적 고찰」(『한국음악연구』46, 한국국악학회, 2009)
- 한국구비문학대계(https://gubi.aks.ac.kr)
- 한국민속대백과사전(http://folkency.nfm.go.kr)